경주8 - 동해안
鶴이 날아 갔던 곳들/발따라 길따라경주를 탐방하는 사람들이 놓치기 쉬운 곳이 경주의 동해안이다. 요즈음은 대중교통수단이 발달하여 비교적 쉬워졌지만 아직도 먼길이라 쉽게 다가가지 못한다. 하지만 동해안은 시내 일대에서 보기 어려운 여러 가지가 있으니 경주를 탐방하는 분들은 꼭 동해안을 가 보시기를 둘러 보시기를 바란다.
동해안은 제법 길이 멀기에 하루에 돌아보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내가 해파랑길을 걸을 때 경주 일대의 동해안을 걸으면서 보았던 것을 기본으로 기록한다.
경주의 문화적 유적이 아니고 자연의 특이한 풍경을 구경하는 첫째가 주상절리다. 우리나라 여러 곳에 주상절리가 많지만 경주의 주상절리는 솟아 오른 것도 있지만 누워 있는 것이 특징이다.
주상절리(Columnar joints, 柱狀節理)는 기둥모양의 절리(節理, joint)라는 뜻으로, 절리는 지형 용어로 암석에 생기는 갈라진 틈 또는 결을 의미한다. 주로 화산 지대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화산암인 현무암에서 주상 절리가 많이 나타난다. 마그마가 흘러나와 급격히 식을 때에는 부피가 수축하여 사이사이에 틈이 생기게 되는데, 오랜 시간 동안 풍화 작용을 받게 되면 굵은 틈이 나타난다. 이것이 바로 절리인데, 주상 절리는 단면의 모양이 4~6각형의 긴 기둥 모양을 이루는 절리를 말한다. 보통 단면의 크기는 수 센티미터에서 수 미터에 이르기도 하며, 기둥의 길이는 수 미터에서 긴 것은 수십·수백 미터에 이르기도 한다. 주상절리는 보통 육각형의 단면을 가지는 돌기둥들이 규칙적으로 붙어서 연속적으로 나타나, 그 독특한 형상으로 인해 관광지로 개발된 곳이 많다.
제주도 중문해안에는 기둥 모양의 주상 절리가 절벽을 이루고 있으며, 정방폭포와 천지연 폭포가 주상 절리에 해당 한다. 광주 무등산의 입석대와 서석대를 이루는 주상절리는 둘레가 7m, 길이가 약 10m가 되는 큰 규모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경기도 연천의 재인폭포, 임진강 주상절리, 강원도 철원의 직탕폭포, 경북 포항 달전리 주상절리, 경주 읍천리 해안가 와상절리 등 여러 곳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국가지질공원 및 각종 기념물로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으며, 관광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북한에 있는 총석정도 유명한 주상절리에 해당하는데 가 볼 수가 없으니 안타깝다.
한편 주상절리와는 달리 쪼개지는 절리의 방향이 수평으로 넓게 나타나는 절리를 판상(板狀)절리라 한다.
경주 양남 주상절리군(慶州 陽南 柱狀節理群)은 경주시 양남면 읍천항과 하서항 사이의 해안을 따라 약 1.5km에 이르는 2012년 9월 25일에 천연기념물 제536호로 지정된 주상절리이다. 신생대 제3기의 에오세(5400만 년 전)에서 마이오세(460만 년 전) 사이에 경주와 울산 해안지역 일대의 활발했던 화산활동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추정한다.
이곳의 주상절리는 비스듬히 기울어져 있거나 수평 방향으로 발달해 있으며, 부채꼴(방사형)로 퍼져나간 것도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렇게 형태가 다양한 것은 마그마가 지표면 위로 분출하지 못하고 지각 얕은 곳으로 스며들어간 상태에서 냉각과정을 거쳤기 때문인 것으로 본다. 수평, 수직, 경사, 방사 형태 등 모든 방향의 주상절리가 대규모로 모여 있고, 흔히 볼 수 없는 부채꼴 주상절리가 발달해 있다는 점에서 희소성이 있다.
이곳 해변에는 10m가 넘는 정교한 돌기둥들이 1.7㎞에 걸쳐 분포해 있으며, 주름치마, 부채꼴, 꽃봉오리 등 다양한 형태의 주상절리가 존재한다. 그리고 몽돌길, 야생화길, 등대길, 데크길 등 해안 환경을 고려한 테마로 1.7㎞에 걸쳐 주상절리 전 구간을 산책할 수 있는 파도소리길이 조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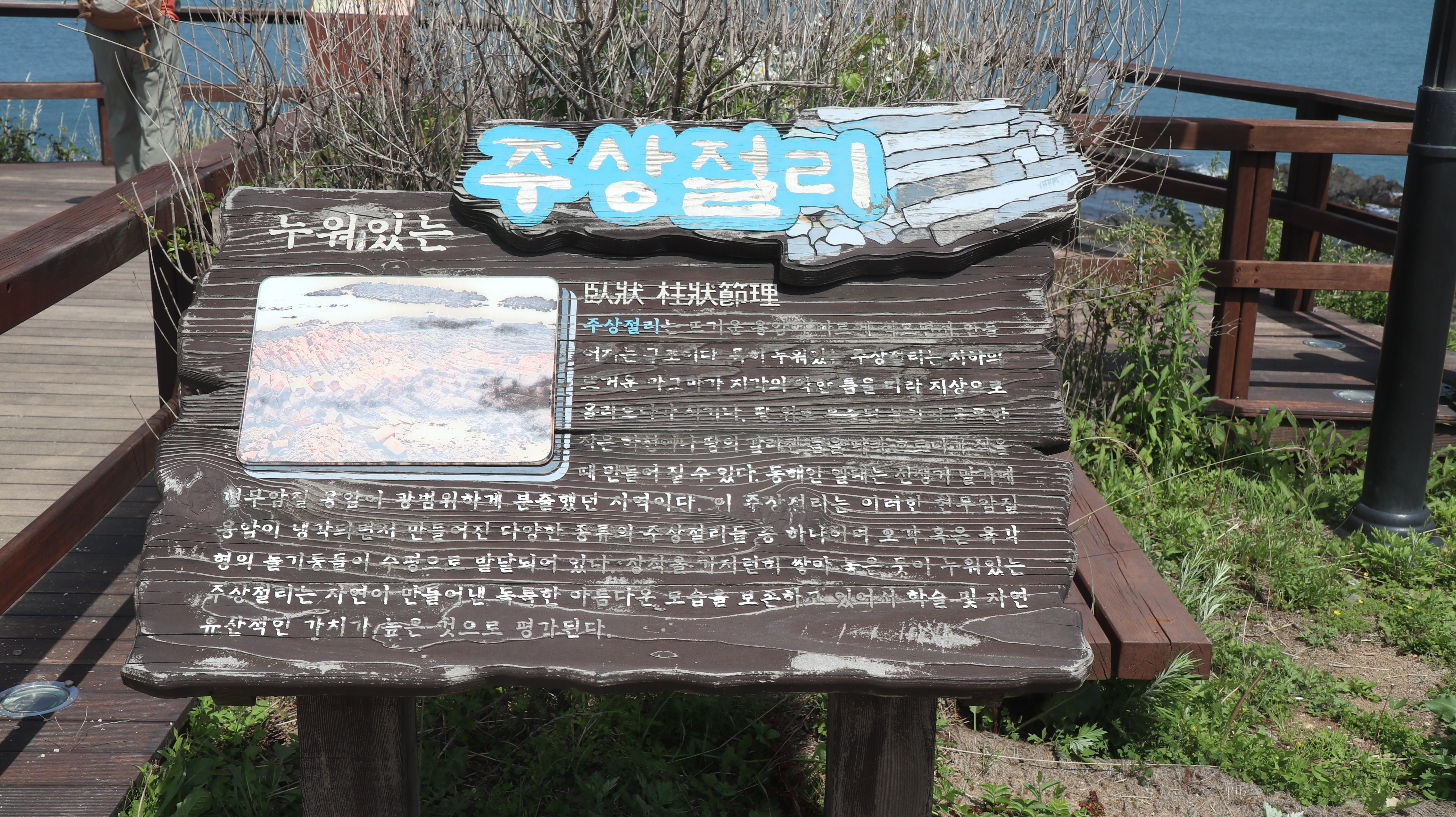



주상절리의 여러 모습

멀리 보이는 양남면 주상절리 전망대






여러 형태의 주상절리

양남면 주상절리 전망대
양남녕 주상절리 전망대에 올라가서 보는 주상절리는 실제로 아래에서 보는 것보다 못하다. 더구나 2층의 테라스는 바람이 조금 불어도 개방을 하지 않으니 무용지물이다, 내려와서 전망대 주변에서 보는 주상절리가 더 깨끗하고 아름답게 보인다. 예전에 이 전망대가 없을 때도 주상절리를 잘 보았는데 별 쓸모도 없는 전망대를 만들어 놓은 것 같은 기분이다. 전망대를 만드는데 들어간 예산도 많을 것이고 지금 유지하는 경비도 적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니 전형적인 행정의 오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월성원자력발전소의 도움으로 건립되었다 하지만......











여러 형태의 주상절리
양남면 주상절리지대를 지나 바닷가를 따라가면 문무대왕릉이 나온다.
경주 문무대왕릉(慶州 文武大王陵)은 경상북도 경주시 문무대왕면 봉길리 봉길해수욕장 맞은 편 동해 바다에 있는 작은 바위섬으로 사적 제158호로 대왕암(大王岩)이라고도 한다. 삼국통일을 이룬 문무왕(文武王)은 국가의 안위를 위해 죽어서도 국가를 지킬 뜻을 가졌다. 삼국사기 신라본기 제7 문무왕 편에 의하면 ‘7월 1일에 왕이 돌아가시므로 문무라 시호하였는데 그 유언에 따라 동해구의 대석상에 장사하였다. 속전에는 왕이 용으로 화하였다하여 그 돌을 가리켜 대왕석이라고 하였다.’(김종권역)고 전한다.
육지에서 불과 200여 미터 떨어진 가까운 곳에 있는 대왕암은 큰 바위가 주변을 둘러싸고 있고, 중앙에 약간의 넓은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에 대석을 이동하여 배치한 것으로 여겨진다. 중앙의 대왕암 주변 네 방향으로 자연적으로 물길이 나 있는 상태이나 약간의 인공을 가하여 튀어나온 부분을 떼어내어 물길이 난 가운데 공간을 약간 가다듬은 흔적이 발견되었다.
대석의 안치 방법과 유골의 수장 여부에 대한 의문점을 풀기 위해 2001년 3월 한 방송사에서 역사연구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초음파 탐지기 등을 이용하여 바위의 조직과 바위의 내부 및 수면 아래를 조사한 결과 유골이나 부장품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대왕암이 1967년에 '발견'했다고도 알려져 있지만, 이미 일제강점기인 1939년에 고유섭이 발표한 <경주기행의 일절>에서도 '모름지기 경주에 가거든 동해의 대왕암을 찾아 문무왕의 정신을 기려 보라'고 할 정도로, 이미 대왕암이 문무왕의 유적이란 건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었다.
결론적으로 대왕암은 문무왕의 유골함이나 부장품은 없지만, 문무왕을 기리는 추모 공간이자 사적으로서 '해중왕릉'의 의미는 여전히 충분하다.
문무대왕릉 부근은 그냥 평범한 바닷가다. 이 부근을 유적지로 개발하여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예를 들면 문무대왕릉 주변을 도는 유람선 같은 것을 정기적으로 취항하면 어떨까?하는 생각도 들었다.




문무대왕릉 주변과 안내판
여기서 감은사지로 발길을 돌려 걸으면 제법 큰 하천이 나오는데 이름이 대종천이다. 그리고 그 하천을 건너는 다리 이름이 대종교이다. 왜구가 침입하여 큰 종을 약탈해 가다가 이 하천에 종을 빠뜨렸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는 곳이다.


대종천

이정표
대종천을 거슬러 올라가면 오른쪽으로 조금 높은 땅에 두개의 석탑이 보인다. 감은사지 석탑이다.
경주 감은사지(慶州 感恩寺址)는 신라를 통일하고 동해 바다의 용이 된 문무왕을 위하여 만들었다는 설화가 전해지는 감은사 절터로 사적 제31호이다. 삼국유사에 따르면 이곳은 동해에서 서라벌로 들어가는 길목에 자리하고 있는데, 이 길을 통해 왜구의 침입이 잦아지자 부처님의 힘으로 물리치기 위하여 문무왕이 감은사를 짓기 시작하였으나 끝내지 못하고 죽었기 때문에 신문왕이 그 뜻을 이어 682년에 절을 완공하여 감은사라 이름하였다. 이는 불심을 통한 호국이라는 부왕의 뜻을 이어받는 한편 부왕의 명복을 비는 효심의 발로였던 것이다. 절터는 동해에 이르기 직전의 산기슭에 있는데, 거기에는 큰 3층 석탑 2기가 동남으로 흐르는 대종천(大鐘川)을 앞에 두고 서 있다. 감은사지 삼층석탑은 통일시기 신라인의 기상을 나타내는 큰 탑으로, 이후 만들어지는 신라 삼층석탑의 원형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멀리서부터 잘 보이는 두 개의 삼층석탑은 금당 앞으로 동과 서에 하나씩 놓여 있다.
두 개의 탑보다 이야기로 남아 오랫동안 기억되는 것은 금당 자리의 석축이다. 금당 아래 석축 사이로 제법 큰 공간이 비어 있음을 볼 수 있는데, 동해 바다의 물이 드나드는 길로 동해의 용이 된 문무왕이 오가던 길이라고 한다. 문무왕이 죽어서 묻혔다는 수중 능도 가까이 있어 그 이야기가 정말일까 고개를 끄떡이게 한다. 곳곳에 놓인 석재에는 보통 절에서 사용하지 않는 문양인 태극무늬가 새겨져 있어 이색적이다.
또한 중문의 남쪽으로 정교하게 쌓은 석축이 있으며, 이 석축의 바깥으로는 현재 못이 하나 남아 있다. 이를 용담이라 부르는데, 통일신라 당시 감은사가 대종천변에 세워졌고 또 동해의 용이 드나들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진 것이라면 이 못이 대종천과 연결되어 있고 또 금당의 마루 밑 공간과도 연결되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가능하게 한다.















감은사지 석탑의 여러 모습
경주 동해안의 자연과 문화유적은 과거 해파랑길을 걸으며 찍어두었던 사진을 추려서 편집하엿다. 해파랑길 소개에는 더 많은 사진이 있으니 나의 블로그 해파랑길 10코스와 11코스를 참조하시기를 바란다.
'鶴이 날아 갔던 곳들 > 발따라 길따라'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경주10 - 불국사, 석굴암 (0) | 2025.02.22 |
|---|---|
| 경주9 - 동쪽(골굴사, 기림사) (0) | 2025.02.16 |
| 경주7 - 서악 일대 (1) | 2025.02.06 |
| 경주6 - 남산지역, 서남산 일대 (3) | 2025.01.25 |
| 경주5 - 남산지역, 동남산 일대 (1) | 2025.01.22 |